신상구 교수, "부작용 - 치료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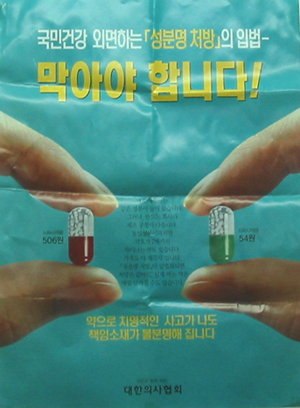
서울의대 약리학교실의 신상구 교수는 최근 발표한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이라는 글에서 정부와 약계의 성분명 처방 논리를 정면으로 반대했다.
신상구 교수는 우선 정부가 제네릭의 가격을 영국 같이 세계적으로 약가가 가장 높은 오리지널의 80%까지 인정하는 마당에 어느정도의 약제비 절감효과가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제기했다.
신 교수는 WHO가 복제의약품에 대해서 질적보증(Quality Assurance)이 필요함을 천명하고 있고, 미국은 생동성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해 바이오리서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곧 미국은 임상과 실험 부분을 나누어 신뢰성과 윤리성을 검증하고 있고 제네릭은 사후 질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제의약품의 시급한 확대라는 슬로건하에 생동성 시험의 질 보등을 위한 실사제도를 없애는 등 더욱 후퇴하고 있다고 신 교수는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현재 흡수량이 80~125% 범위 내에 들면 약동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의 특성과 약물 자체의 특성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역/치료력이 좁은 경우에 부작용이나 치료실패율이 매우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회 처방시 그 때마다 다른 회사 제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치료결과의 예측이 더욱 어렵게 된며 효과의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현재의 생동성 시험은 평균 생물학적 동등성(average bioequivalence)으로, 이는 복제약 허가의 최소 요건일 뿐 대체조제의 필요충분한 조건의 의미는 아니라고 제기했다.
의약품의 제품간 호환성(interchangeability)은 처방능(prescribability)과 대체능(switchability)이 있는데, 현재의 평균 생동성은 이를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학자들은 그 전제로 집단 생동성과 개인 생동성 시험의 만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미 FDA는 이를 충족시키는 기준의 생동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험이 복잡해 제약사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물의 특성에 따른 새로운 시험법의 적용여부를 FDA와 상의하고 있는데, 이경우 환자의 특성에 따른 임상적 판단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생동성시험이 필요한 품목이 2500여 개로 추정되는데, 그 중 20%도 안되는 427개 제품(64성분)을 가지고 성분명 처방을 한다는 언급 자체가 시기 상조 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약제비 절감 노력은 수긍하나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 및 치료 실패로 인해 추가되는 2차 의료비용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신 교수는 성분명 처방을 굳이 실행하려면 객관적인 시뮬레이션이나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입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