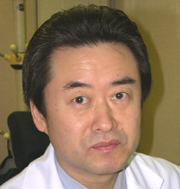
이렇게 표현하면 실례가 될까. 그러나 박영우 이사의 모습은 실제로 그랬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의 책상 위에는 두터운 법률 관련 서적이 잔뜩 펼쳐져 있었다.
박 이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외에는 줄곧 법률 서적과 씨름을 한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을 청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서울시의사회(박한성)의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업보 탓이다. 법제이사로서의 제 몫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의료광고는 윤리 측면이 앞서야"
박 이사는 최근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의료광고 관련 토론회에서 '의료광고 간판문제에 대한 해석'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료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나치게 의료광고를 규제할 경우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는 직업상 자유권을 제한하게 된다. 반면 의료광고가 잘못 확대되면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으로 회원간 갈등 및 분열을 가져오고, 의료가 자칫 상품화 또는 상업화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의료계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윤리적 정화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광고 특별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제안했다.
현재 구성돼 있는 의료광고 특별심의원회는 사후 심의를 통한 규제기능역에 머무르고 있다. 공신력 있는 민간기구로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광고제작 단계에서부터 개입해야 한고 박 이사는 주장한다. 광고제작자에게 심의 기준에 맞는 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현행 의료법 45조에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고, 46조 2항에서는 광고허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박 이사는 이와 관련 의료인의 광고행위가 법적 규제 이전에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행위에 상업적인 고려가 우선시 될 수 없는 만큼 의사의 '양심'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의료광고는 절대 상품화 또는 상업화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윤리문제를 담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의사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술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자율규제 방안 마련돼야"
지난 10월22일 공정거래위에서는 65개 의료 및 의약품 관련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규제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연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큰 폭으로 개선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도 빠른 시일 내에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는 WTO 체제에 의한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뉴라운드와도 맞물려 있다. 영리병원제의 도입과 이로 인한 의료광고 허용, 민간보험의 도입 등 모든 의료체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의료광고의 규제완화도 어쩌면 자연스런 시대적 흐름이라고 박 이사는 설명했다.
"현재와 같은 규제 및 통제 일변도의 의료체계는 공공의료, 의료광고, 강제지정제, 민간보험문제, 의료인 단체의 자율권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자율적인 체제가 도입돼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의료체계는 큰 전환기를 맞게 될 겁니다."
다만 그는 의료광고 규제가 완화될수록 기사성 광고, 광고성 기사, 무가지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여러 편법·불법광고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방안은 의사회 자체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적극적인 해석과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사이비·유사·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이들의 무분별한 광고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박 이사는 주문했다.
◇간판문제 '사전인증제' 도입 필요
박 이사는 의료기관의 간판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초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31조)에서 '명칭표기 및 간판크기'에서 명칭표기는 진료과목 명칭의 1/2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형외과나 비뇨기과 등이 주로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기관 간판에 대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불필요한 정부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한 의료기관의 불이익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각 과목별로 의료기관 광고의 규제 여부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갈려 있습니다. 서울시 개원의의 70% 이상은 규제완화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입니다. 각종 불법·허위광고의 확대로 의료계 전체가 비난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간판문제만큼은 사전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꿈꿔"
허위·과대광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상호 신뢰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박 이사는 주장한다. 의료계 현실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유혹(?)이 생길 수도 있다. 자연스레 과당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다. 이 경우 의료계는 공멸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그는 꼬집는다.
"의료사회는 점점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법익침해의 위험성 역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의료기관간 상호 신뢰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원칙은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되겠지요."
박 이사는 현재 서울시의사회에서 '악역(?)'을 맡고 있다. 회원의 권리구제는 물론 징계 문제까지 그에게 주어진 몫이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그는 지난 11월 '의료분쟁에서 무과실 책임주의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으로 법학석사를 취득했고, 내년에는 박사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환자에게는 인술을 베푸는 의사로,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에게는 '법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그는 희망한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