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베르쿠보, 심부전 치료에 또하나의 핵심 기둥
급속한 고령화로 심부전 유병률이 가파르게 증가, 심부전 대란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외 학계에서는 입원을 중심으로 서술했던 심부전 악화의 정의를 확대해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한심부전학회가 보다 선제적으로 약물치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한심부전학회는 지난 2022년, 심부전 진료지침을 전면 개정하면서 주요 임상연구 결과를 선제적으로 반영, 수용성 구아닐산 고리화효소(soluble Guanylate Cyclase, sGC) 자극제 베르쿠보(성분명 베리시구앗, 바이엘)의 권고등급을 해외보다 더 높게 책정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에는 심부전 퇴원 전 체크리스트에 베르쿠보를 추가, ARNI, 베타차단제, MRA, SGLT-2 억제제 등 기존의 4가지 표준요법제에도 불구하고 악화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약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의약뉴스는 대한심부전학회 진료적정위원회 이사로, 심부전 퇴원 전 체크리스트 제ㆍ개정에 참여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순환기내과 김응주 교수를 만나 심부전 치료 패러다임 변화와 베르쿠보의 임상적 가치 및 퇴원 전 체크리스트 추가의 함의를 조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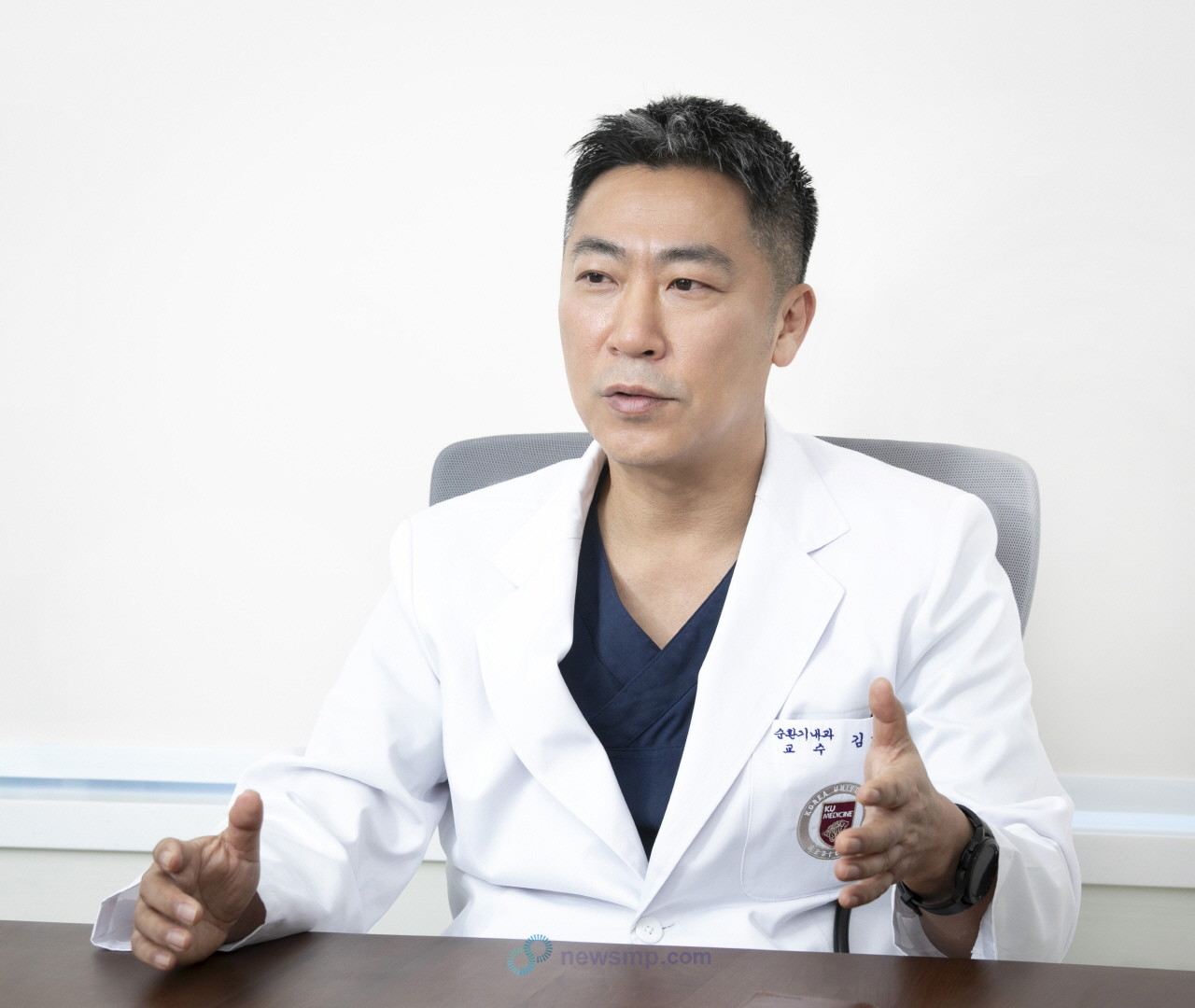
◇심장 질환의 종착역 심부전, 최근 2010~2023년 사이 80% 급증
대한심부전학회 진료지침에 따르면, 심부전의 유병률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례로 미국의 경우 2010년에서 2030년 사이 심부전 환자가 약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심부전의 유병률이 2002년 0.77%에서 2020년 2.58%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심부전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질환이어서, 생존율이 극히 낮은 일부 암종 외 대부분의 암보다 사망 위험이 더 높다.
이에 심장학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심부전이 고령화 시대 심각한 보건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김 교수는 “심부전은 모든 심장질환의 종착역이라고 불리는 질환”이라며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치료 약제가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졌던 질환이었는데, 요즘에는 여러가지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면서 관심이 높아졌고, 진단 방법의 발전으로 진단 비율이 높아지면서 유병률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심부전(질병코드I50) 환자 수는 2010년 9만 9708명에서 2023년 18만 306명으로 약 80%가량 증가했으며, 고령화와 맞물려 심부전의 유병률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고혈압, 당뇨, 비만, 허혈성 심장질환 등 원인질환 및 위험 인자 증가도 심부전 유병률이 증가하는 원인”이라며 “여기에 심근경색, 판막질환, 부정맥 질환 등 심장질환 치료 성공률 향상에 따른 심장질환자의 수명 연장이 심부전 환자 수 증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심부전이 고령화 시대 심각한 보건 이슈 중 하나로 꼽히는 가장 큰 이유는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심부전에 효과적인 치료제들이 줄지어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치료 목표는 재발을 억제하는데 그치고 있다.
김 교수는 “안타깝게도 심부전은 완치라는 개념이 없다”면서 “약물로 심장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았던 상황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으로, 약물 치료를 평생해야 하기 때문에 완치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약물치료를 해도 일부에서는 재발과 악화가 반복된다”면서 “악화로 인한 입원이 반복되면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1년에 4회 이상 입원하면 절반 이상이 그 다음 해에 사망한다는 데이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재입원은 환자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입원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이에 심부전 치료는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을 관리함으로써 환자의 재입원을 줄이고, 기능적인 부분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심부전 치료 패러다임 전환, 선제적 치료 강조
심부전은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 악화로 인한 재입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입원을 반복할수록 사망의 위험도 증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악화를 막는 것을 심부전 치료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앞서 말했듯 심부전은 사실상 완치가 어렵고 증상 악화로 인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례로 박출률 감소 심부전(HFrEF) 환자 2명 중 1명은 퇴원 후 한 달 이내에 악화로 재입원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부전 악화로 인한 재입원은 결국에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박출률 감소 심부전 환자가 최근에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이나 심부전 증상 악화를 경험하면, 이전에 심부전으로 입원한 적이 없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의 외래 환자보다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심혈관계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4배가량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심부전 치료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심부전 악화의 개념을 확대, 보다 선제적으로, 보다 더 강력한 치료를 시행하도록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23년 유럽심장학회 심부전협회(ESC-HFA)의 성명서에서 시작됐다.
ESC-HFA는 ‘만성 심부전 악화의 정의, 역학, 관리 및 예방에 대한 임상 합의 성명서’에서 심부전 악화를 ‘기존 심부전 환자의 심부전 징후 및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 강화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정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를 권고했다.
김 교수는 “심부전 환자의 제일 큰 문제는 반복적인 입원으로, 심부전 환자는 연평균 약 1.4회정도 입원하게 되며, 그 중 4분의 3은 대개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한다”면서 “이처럼 숨이 차는 증상 등으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응급실에 오면 이미 환자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지 않고, 응급실 격리 시 경제적 부담도 클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치료하는 환자에 비해 최적의 치료를 받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가 정말 응급한 상황이 아닌 경계선 정도라면 정맥 이뇨제를 투여하고 경구 이뇨제 용량을 올려서 단기 추적 관찰(Short term follow-up) 한다”며 “연장선상에서, 응급실을 가야 하거나 외래 주사실에서 정맥 이뇨제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전보다 심부전이 더 악화됐다면, 경구 이뇨제 용량을 늘리고, 평소처럼 2개월, 3개월, 6개월 등의 주기가 아닌 1~ 4주 이내로 단기 추적 관찰한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심부전은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심부전 악화의 정의를 넓혀서 환자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이 반복될수록 사망률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년 대한심부전학회 팩트 시트에 따르면 입원을 경험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에 예후가 매우 다르다”며 “따라서 입원을 막는 것도 심부전에서 주요한 치료 목표 중 하나”라고 역설했다.
이에 “이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2023년 유럽심장학회-심부전협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심부전 악화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폭넓게 제시한 것”이라며 “입원 전 외래에서도 심부전 악화에 대한 관리 및 치료를 함으로써 재입원을 막는다는 의미로, 전문가들 역시 충분히 일리가 있다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부전 치료 패러다임 전환, Rapid Sequencing
심부전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에는 혁신 신약들이 자리하고 있다. ARNI나 SGLT-2 억제제 등 심부전의 다양한 단계에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제들이 연이어 등장, 선택지를 확대한 것.
특히 베타차단제나 MRA 등 기존의 심부전 치료제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병용요법을 시행해 선제적으로 심부전 악화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김 교수는 “환자가 심부전을 진단받으면 곧바로 적극적인 약물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박출률 감소 심부전 환자에서 1차 치료를 할 때 표준치료제인 4pillar(RAAS 차단제, 베타차단제, MRA, SGLT-2 억제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면서 “2016년까지만 해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부전 임상시험에 적용해 효과가 입증됐던 순서대로 RAAS 차단제나 베타차단제, MRA를 차례대로 추가하면서, 각 단계별로 해당 약물을 목표 용량까지 상향 적정(up-titration)하는 방식으로 치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프로세스로, 2021년에는 보다 빠르게 치료제를 추가해 4주 내에 진행될 수 있는 신속한 시퀀싱(Rapid sequencing)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현재는 유럽(2021)과 미국(2022)에 이어 2022년 국내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됨에 따라 ‘시퀀싱(Sequencing)’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약간의 순차적인 부분은 있지만 거의 동시에 사용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환자마다 혈압이나 맥박, 신장 기능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재원 중에 4pillar를 최소한의 용량(Minimum Dose)으로라도 시작하자는 것이 현재 추세”라며 “이후 각 약제의 목표 용량(Target Dose) 또는 최대 내약 용량(Maximum Dose)까지 올릴 때에 환자 상태에 맞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적어도 재원 중에 그리고 퇴원 전까지는 특별히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적어도 4pillar를 하나도 빠짐없이 사용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4pillars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한 베르쿠보
심부전 치료의 4가지 핵심 기둥(pillar)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환자들이 악화를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각 약제의 한계로 4pillars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없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
이 가운데 베르쿠보는 4pillars와는 다른 새로운 계열의 심부전 치료제로, 표준요법(4pillar)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치료되지 않은 심부전 환자들의 악화 위험을 줄이며 심부전 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했다.
김 교수는 “(4pillars는) 모두 좋은 약제들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저혈압이나 신기능저하, 고칼륨혈증 등의 문제로 인해 환자에게 네 가지 약제를 최대 내약용량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히 심부전 치료를 받는 경우 대부분 이미 고혈압, 당뇨병 등의 복합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치료제 사용에 더욱 제약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례로 심부전 악화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는 7명 중 1명이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악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환자들이 치료의 미충족 수요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환자들이 반복되는 심부전 악화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틈새를 메워주는 2차 치료제 옵션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이 가운데 최근 심부전 악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베르쿠보가 등장하면서 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베르쿠보는 진료지침에 따른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심박출량이 45%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고위험 만성심부전 환자 50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3상 임상, VICTORIA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 연구 중 추적관찰 10.8개월 시점에 1차 복합평가변수인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첫 입원의 위험을 위약 대비 10%(HR=0.90) 줄인 것.
위약 대비 뛰어난 효과가 조기부터 확인돼 임상을 조기에 종료, 두 그룹간 상대 위험비가 0.90에 그쳤지만, 절대적인 감소폭(Absolute Risk Reduction, ARR)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환자 100인년(patient-years) 당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사건을 4.2건 줄인 것.
NNT(Number Needed to Treat)는 24로, 24명을 치료하면 1명에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21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획득했으며, 2023년 9월 1일에는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
또한, 대한심부전학회는 2022년 진료지침을 개정, 베르쿠보를 심부전 악화 고위험 군에서 기존 약제에 추가할 수 있는 2차 약제 중 하나로 제시하며 권고 수준을 해외보다 더 높은 Class Ⅱ a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베르쿠보는 VICTORIA 연구에서 1차 평가변수(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또는 첫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까지 걸리는 시간)를 낮췄지만 상대 위험 감소율(relative risk reduction)이 10%로 나타나 처음에는 다소 회의적인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이 연구는 추적 관찰기간이 짧았고 후속 연구에서 비슷한 기간으로 추정(estimation)을 했을 때 상대 위험 감소율은 작지 않았으며, 절대 위험 감소율이 상당히 좋았고 NNT가 다른 치료제에 비해 뒤처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VICTORIA 연구의 사전 지정 하위그룹 분석에서 베르쿠보는 무작위배정 전 3개월 내에 심부전 악화로 정맥 내 이뇨제 치료를 받은 외래 환자에서 1차 평가변수인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첫 입원의 위험이 위약군 대비 약 22% 낮은 경향을 보였다(HR=0.78, 95% CI 0.60-1.02).
또한 VICTORIA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을 베이스라인 NT-proBNP 사분위수(quartile) 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베르쿠보는 NT-proBNP 1~3 사분위수(≤5314 pg/mL) 환자에서 심혈관계 사건으로 인한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첫 입원의 위험이 22% 낮았다(HR=0.78, 95% CI 0.69-0.88, p<0.001).
김 교수는 “후속 분석 결과를 보면서 베르쿠보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Class Ⅱa까지 진보적으로 권고했다”며 “후속 연구들이 더 나와서 근거(evidence)가 조금 더 탄탄해지면 1차 치료제로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실례로 “최근 유럽심장학회(ESC)나 미국심장학회(ACC) 등 주요 학회에서도 Rapid sequencing 방식과 함께, 일각에서는 베르쿠보를 포함한 5제 요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러한 치료 방식은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를 빠르게 사용해 치료 효율을 높이고, 질환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무엇보다 그는 “심부전은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치료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치료제를 빠르게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베르쿠보는 현재 4주 이상의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심부전 악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입원 환자가 아니라 외래에서도 증상 악화의 조짐이 보인다면 베르쿠보를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베르쿠보는 단순히 2차 치료제가 아니라 심부전 치료의 또 하나의 핵심기둥으로 가치가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베르쿠보를 통해 치료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전언이다.
그는 “베르쿠보는 등장 이후 심부전 악화 환자의 관리 및 치료에서 적극적으로 치료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옵션으로 자리 잡았으며, 개인적으로도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들에게는 가능한 사용하고 있다”면서 “외래에서 표준치료인 네 가지 약제를 사용해 치료했음에도 숨이 차는 경우, NT-prBNP가 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체액이 오버로드(volume overload) 되어 정맥용 이뇨제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정맥용 이뇨제를 처방한 후 베르쿠보를 함께 사용하는데 확실히 증상 개선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베르쿠보를 악화 초기 단계에 쓰면 첫 입원 위험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만약 베르쿠보가 1차 치료제로서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임상연구를 진행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1차 치료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의 1년 생존율은 84%, 5년 생존율은 66%에 불과하며, 이는 암 환자의 최근(2017~2021년) 5년 상대생존율(72.1%)보다도 낮은 수치”라면서 “특히 심부전 악화로 입원을 경험한 환자의 생존율은 외래에서 미리 진단해 추적 치료하는 환자에 비해 생존율이 현저히 낮아서, 15년을 놓고 보면 입원 환자의 생존율은 34%로 외래 환자(7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초기 단계(Early stage)에서부터 관리해서 입원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베르쿠보는 신약이기 때문에 1차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면서 “비용효용성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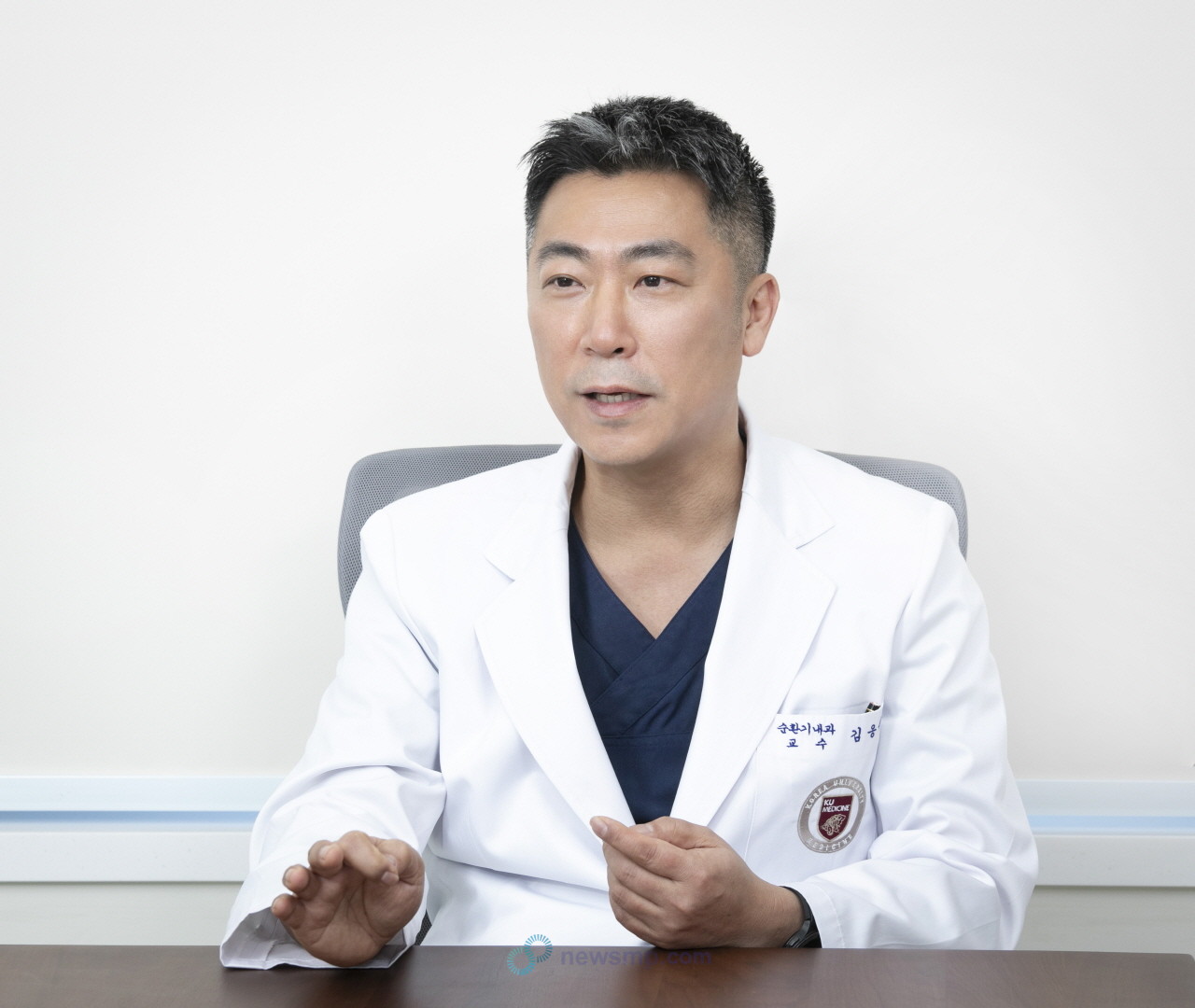
◇퇴원 전 체크리스트 추가, 핵심 pillar 자리매김
한편, 대한심부전학회는 지난해 심부전 퇴원 전 체크리스트를 개정, 투약한 약제 리스트에 베르쿠보를 추가했다.
ARNI, RAAS 차단제, 베타차단제, MRA, SGLT-2 억제제 등 4pillars와 함께 심부전 치료의 핵심축으로 제시한 것.
김 교수는 “대한심부전학회는 2019년부터 심부전 퇴원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심부전 환자가 퇴원 전 꼭 필요한 치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돕고 있다”면서 “심부전 퇴원 전 체크리스트는 의료진들이 심부전 환자가 퇴원 전에 꼭 받아야 할 치료들을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으로, 이 리스트를 활용하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적절한 치료제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퇴원 전 체크리스트에는 가이드라인에서 Class Ⅱa 이상으로 권고하는 약제를 담으려고 했다”며 “베르쿠보는 심부전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한 2차 약제로서 현재 보험급여 적용도 받고 있으며, 대한심부전학회 가이드라인에서 높은 단계(Class Ⅱa, Level of Evidence B)로 권고하고 있는 약제라 최근 체크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심부전 악화 환자에서 최적 약물 치료(Optimal Medical Therapy, OMT)를 목표 용량까지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에 비해 베르쿠보는 작용 기전이 기존 치료제와 다르고 혈압이 덜 감소하고 신장 기능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이런 면에서 퇴원 전에 환자의 컨디션과 바이탈을 보면서 베르쿠보를 시작해 볼 수 있으며, 또한 환자들의 재입원 상황을 낮추는 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적응증에 해당한다면 베르쿠보를 고려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베르쿠보가 4가지 표준치료제로도 악화의 위험이 있는 심부전 환자들의 악화 예방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입원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김 교수는 “퇴원 이후에는 외래에서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를 이어가게 된다”면서 “앞서 말했듯 심부전은 재발과 악화를 빈번하게 반복하기 때문에 외래에서 악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입원을 할 수밖에 없으며, 심부전 악화 사건을 경험한 환자 중 3개월 이내에 심부전으로 재입원할 확률은 많게는 50%에 이르고, 2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은 20% 정도 되기 때문에 재입원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증 심부전 치료환자들은 혈압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 4pillar는 혈압을 떨어뜨려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면서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면 대안이 없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베르쿠보가 나오면서 새로운 무기가 생겼다”며 “퇴원 후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다시 숨이 찬다거나 심지어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도 체중이 늘어난다거나(체액증가) 하면 외래에서 정맥용 이뇨제 처방 후 베르쿠보 처방하고 상태를 지켜보면서 증상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베르쿠보의 국내 허가임상인 VICTORIA 연구를 살펴보면, 베르쿠보는 심부전에서 가장 중요한 재입원을 줄였고, 서브분석에서는 NT-proBNP 8000pg/mL이하 환자에서 심혈관계 사망도 줄이는 것을 확인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도 심부전 증상 악화 환자들에게 유사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애초에 최적의 약물 치료를 하고 있던 환자가 급성 심부전 악화로 다시 입원했다면, 베르쿠보를 2.5mg 시작 용량부터 처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베르쿠보를 심부전 퇴원 전 체크리스트에 포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외래에서는 입원 당시보다 새로운 약물을 시작하기에 부담이 있어 입원 시에 처방한 약물을 반복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 약이 빠지면 계속 빠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퇴원 체크리스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치료제를 잘 병용하면 예후 개선 가능 ‘Keep Standards for Heart Failure’
심부전 치료제가 늘어나면서 치료 성적도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완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용한 옵션을 최대한 활용해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심부전 치료의 핵심 전략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최적의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전언이다. 무엇보다 심부전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부담은 물론, 암보다 높은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증질환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상급종합병원평가에서 중증 비율(portion)이 높아야 하는데, 심부전은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면서 “최소한 심부전 악화로 인한 입원을 경험한 경우는 중증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웬만한 암 보다도 심부전이 생존율이 낮은 것에 비해 상급종합병원 특혜를 포함한 솔루션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심부전이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현재 학회 차원에서 정책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과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학회에서는 가용한 치료 옵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료적정위원회를 구성, 치료의 질(Quality of Care, QoC)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 대한심부전학회에서 진료적정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는데, QoC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퇴원 전 체크리스트도 홍보이사를 맡았을 당시에 처음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진료적정위원회가 생겨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하는 데 분명히 도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여기에 더해 “추가로 2020년 발간했던 핸드북도 업데이트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발간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학회에서 KSHF QoC 레지스트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치료제를 잘 병용(combination)했을 때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할 수 있는데, 의료진들의 관성 등의 요인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른 치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계획한 활동”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진료적정위원회에서는 대한심부전학회 영문 약자를 활용해 캠페인 이름을 KSHF(Keep Standards for Heart Failure)로 설정했다”면서 “미국심장협회(AHA)에서는 ‘Get With The Guideline’이라는 이름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아직까지는 심부전이 완치가 불가능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반복된 악화로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치료제가 개발되며 치료 성적도 개선되고 있는 만큼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심부전이라는 질환은 만성적이고 진행되는 질환으로, 긴 치료 과정이 다소 힘들거나 지칠 수 있다”면서 “특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보면 전체적인 신체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역시 커지고 치료의지 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나 “지난 2~30년 동안 심부전 치료 분야도 점점 더 발전하고 새로운 약제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전문의를 믿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